김형일 성명학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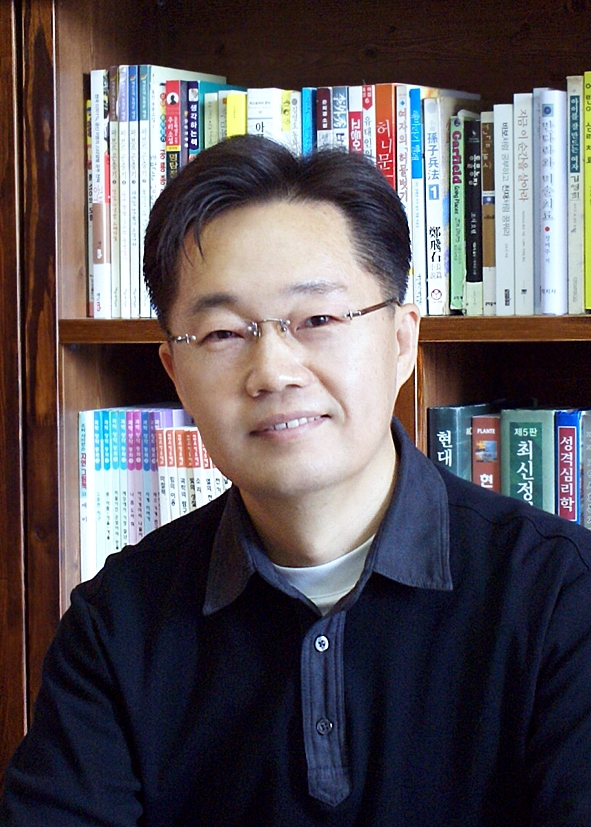
[세상을 보며] 김형일 성명학 박사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왜 우리 사회는 직업의 높고 낮음을 평가한다. 이 같은 이중적 잣대는 개인의 차이인가 시대적 기준인가. 어쩌면 개인의 가치관보다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인 시각이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한국고용정보원의‘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2012년~2018년)’자료에 직업 종류는 총16,891개로 설치·정비·생산직종(5,94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직종(306)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은 약 5,000여개 등장하였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의 변화, 직업의 세분화, 정부정책에 의한 결과였다. 이 같은 변화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구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영화필름 자막제작원 등 18개 직업은 종사자가 없어 소멸되었다.
이처럼 직업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되지만 관료(官僚)에 대한 선호만큼은 변함없이 인기가 높다. 게다가 현 정부는 ‘큰 정부’만들기 정책을 펼쳐 공시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官)은 신하의 무리·기관·공직자·벼슬 등을 의미하며, 삼국시대 관등제도를 시작으로 현재는 보다 다양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과거의 관료는 족벌과 양반 문화, 토호 세력 등 개인의 능력보다 권문세족 중심의 사회였으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관노나 노예제도의 영향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하지만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후 선거에 참여한 학연, 지연 등 특권세력이 형성되면서 공직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공무원 선서에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개인의 이익과 독자적 행동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명리학에서 공직자는 태어난 여덟 글자에 정관(正官)이 있는지 가장 최우선으로 살펴본다.
정관은 일간(日干)인 나를 극하는 오행을 말한다. 자신을 잘 관리하고 합리적이며 원리원칙을 고수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모범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반대로 정관과 편관이 없는 사주는 자제력이 없다고 본다.
이처럼 공직자는 적성과 승진 조건으로 관인격(官印格) 또는 관인상생(官印相生, 정관이 인성을 생조하는 형상)을 갖추어야 좋다.
필자가 공무원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할 때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정년보장, 워라벨 등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원하였다고 말한다.
지난해 H일간지가 입사 후 5년 이내 퇴사자를 조사하였다. 서울시 25개 구(區)를 대상으로 입사 후 5년(2013~2017년)이내 퇴사한 공무원은 432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매년 조기퇴사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쟁 아닌 경쟁의 시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공직자라면 개인의 삶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가와 지방, 조직의 규모와 정책방향을 알고 선택한다면 운명이 아닌 ‘필연’이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