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 비탈밭 등에 쟁기 대용으로 사용
 |
농서나 문헌에 보이는 극젱이를 살펴보면 홍만선(1643∼1715)의 '산림경제'와 우하영(1741∼1812)의 '천일록'에는 쟁기와 극젱이가 동시에 수록돼 있는데 여기서 극젱이는 좁씨를 뿌리고 복토하는데, 밭에서 북주기하는데, 이랑을 짓는데 쓴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천일록'에서 극젱이는 한자의 음을 빌어 후치라고 적었고 '산림경제'에서는 '호리'라고 부르고 있다.
극젱이는 쟁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졌지만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보습이 쟁기의 것보다는 조금 큰 것이 보통이고 볏이 없다.
극젱이의 무게는 대략 11∼15㎏이며, 수명은 몸체는 5년가량 쓰며, 보습은 해마다 벼려서 쓴다. 형태는 한마루가 세모꼴로 이뤄진 것은 쟁기와 비슷하나 보습 끝이 무디며 대체로 술이 곧게 내려가고 몸체가 빈약한 점이 다르다.
극젱이는 논에 쓰기도 하지만 주로 밭을 가는 데 쓴다. 일부 산간지방에서는 쟁기와 극젱이의 구분이 없지만 평야지에서 극젱이는 밭에서 이랑을 짓거나, 밭고랑에 난 풀을 긁어 없애고 북을 주는데 주로 사용한 연장이었다.
그러나 산골에서는 비탈 밭에서는 볏이 없어도 쟁깃밥이 저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볏이 필요 없는 데다가 술이 있는 쟁기는 돌이나 나무뿌리가 많은 곳에서는 보습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극젱이를 갈이에 사용하였다. 이렇듯 극젱이는 바닥이 좁고 험한 곳에서 얕게 갈 때, 또는 쟁기로 갈아 놓은 땅에 이것을 끌어서 골을 탈 때 사용하기도 했다. 쟁기로 갈면 볏밥이 한쪽으로만 갈려 나가나, 이것을 쓰면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감자밭 따위를 매는데 편리하다.
극젱이는 소에 메워 쓰지만, 소가 없으면 사람이 어깨에 멜빵을 메고 끌기도 했다. 처음부터 사람이 끌게 만든 극젱이를 '인걸이'라 부르며, 두 갈래로 가랑이진 채인 성에의 끝에 줄을 매고 어깨나 가슴에 걸어 끌었다. 그리고 평안도 지방에서는 극젱이의 일종인 '밀번지'로 밭고랑의 김을 매고 굳은 흙을 부수는데 사용했다. 밀번지의 보습은 끝이 둥글고 평평한 점이 극젱이와 다르다.극젱이는 하루에 2000여 평의 밭골을 탈 수 있고, 밭갈이는 1000여 평 정도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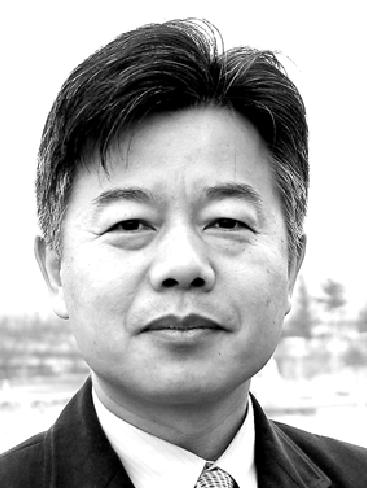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