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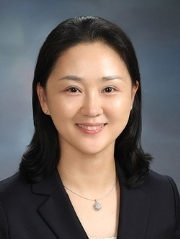
[이영란 변호사] 지난 주말, 한식을 앞두고 미리 한식 모임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선산이 있는 시골에 다녀왔다. 난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한 후에도 친정 쪽 한식이나 벌초 모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참석해왔다. 결혼 한 후에는 남편과 아이도 함께 참석한다. 결혼 전에는 딸인데도 참석해서 일손을 돕는 게 기특하다는 칭찬(?)을 어른들이 하시곤 했다. 결혼하고 나서는 사위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신기하셨는지 갈 때마다 남편에게 공치사를 하시곤 하셨다. 이 씨 집안 행사에 신 씨가 와서 애써줘 고맙다고.
시대가 바뀌어 꽤 오래전부터 딸(여자)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딸이, 그것도 성 씨가 다른 사위와 함께 참석하는 것을 낯설어 하시고, 참석한 사위에게는 고맙다고, 대견하다고 칭찬하신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 씨가 다른 며느리가 와서 일손을 돕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시고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 참석을 못할 경우 못마땅해 하신다. 사위나 며느리나 어차피 성 씨가 다른 건 똑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
그건 아마도 아들만이 집안을 이어가는 존재이고, 딸은 출가외인으로서 다른 집안의 귀신(?)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던 때의 사고방식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일 거다. 그렇지만 비단 남녀평등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아도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는 점에서는 아들과 딸이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나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나의 아버지·어머니가 계시는 산소에 가서 산소를 돌보고 시제를 올리는 데에 왜 아들과 딸이 달라야 하는가? 더군다나 요즘같이 아들과 딸을 차별 없이 키우는 세상에서 말이다.
딸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다른 친척들과 만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은 아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가 있는 곳엔 의무도 따른다. 벌초도, 시제도 아예 지내지 않는다면 모를까, 누군가는 그걸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함께 할 일이라 생각해야 한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나는 딸이니까, 사위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 왔다면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
친정어머니의 비석 옆에 꺾어 온 개나리를 심느라 열심인 조카(남동생의 딸)를 보며, 저 조카가 성인이 될 즈음에는 남편과 함께 할머니의 비석 옆에 꽃을 두러 오는 것이 대견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시대가 될지 궁금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