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물의 끓는점 이용한 증류기
[충청일보]우리 고유의 증류식소주는 찹쌀이나 맵쌀로 등의 곡류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탁주와 약주를 제조한 다음 재래식 증류기인 소줏고리로 증류한 술이다.
소줏고리는 소주를 고아 내는 도구로 요즈음의 증류기구이다. 다른 말로는 고리라고도 하며, 제주도에서는 소주고수리라고 부른다.
대개 오지로 만들지만 간혹 구리나 놋쇠로 만든 것도 있다. 구리나 놋쇠 제품은 위아래가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으나, 오지제품은 한데 붙여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허리가 잘록해 눈사람같이 생긴 그릇의 위·아래·가운데가 모두 뚫려 있으며, 허리 위에 긴 코 같은 대롱이 달려 있다. 뚜껑은 놋대야나 무쇠 솥뚜껑을 이용하는데, 솥뚜껑인 경우에는 손잡이가 밑으로 가도록 거꾸로 덮는다.
맑은 청주를 이용해 소주를 내릴 때는 술의 재료를 솥 안에 넣고 나서 그 솥 위에 이 소줏고리를 올려놓은 다음 솥과 소주고리 사이는 쌀가루나 밀가루를 이겨 만든 시루 번을 붙여서 증기가 새어 나가지 않게 잘 밀착 시킨다.
아궁이에 참나무와 보리 짚을 땔감으로 해 은은한 불을 지펴서 솥에 열을 가해 끓이면 수증기가 소줏고리 뚜껑 아랫면에 서리게 된다. 이때 소주고리 위의 움푹 파인 곳에 찬물을 계속적으로 갈아 주면 내부의 수증기가 식어 박으로 돌출 된 빨주인 긴 대롱을 통해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주다. 뚜껑위의 찬물이 냉각수 역할을 한 것이다. 소줏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가마솥과 솥뚜껑만으로 고아 내기도 했다.
소주는 본래 아라비아인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이나 원나라때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원나라가 일본정벌을 위해 개성과 안동에 병참기지를 건설하고 주둔해 이 두곳이 지금까지도 소주의 명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개성에서는 소주를 아락주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므로 소줏고리의 등장도 고려말이나 조선시대 초기쯤으로 짐작되는데 크기는 대략 40∼60cm정도이며, 큰 것은 아랫부분에 두개의 손잡이가 달려 있다.
소주의 증류원리를 살펴보자. 알코올은 물보다 끓는점이 낮기 때문에 일정하게 열을 가해주면 알코올만 먼저 증발한다.
이처럼 소줏고리는 알코올과 물의 끓는점이 다르다는 원리를 이용해 찹쌀이나 맵쌀로 담근 술인 청주를 끓여 소주를 얻는 장치인 것이다. 즉 오늘날 쓰고 있는 증류기와 모양만 다를 뿐 그 원리는 똑같다. 단지 오늘의 증류기는 대량생산을 위해 그 규모와 방법·재질이 약간 변했다는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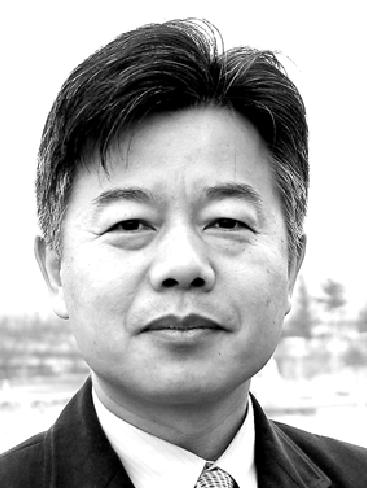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