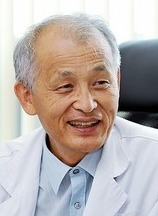
[건강칼럼] 홍세용 진천 성모병원 신장내과장
의사는 생소한 약 보다는 잘 아는 약을 처방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내과 교과서에 있다. 약의 효능과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사가 약에 대한 임상 경험을 두루두루 축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에는 약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건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약은 2018년 기준으로 3만9346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효과가 개선된 신약이 매년 50개가량(미국 FDA 승인 건수와 유사) 출시되기 때문에 기존의 약들은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면 상당수가 과거의 약으로 밀려난다. 마치 최신형 휴대폰이 10년이나 20년쯤 지나면 구닥다리 모델로 전락하는 것과 같다.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치료 지침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약의 부작용이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그러나 부작용의 주 증상이 두통, 소화불량, 피로감, 변비, 설사, 결림 증세, 불면증 등, 우리가 평소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가끔씩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일 경우에는 환자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고 연령층에서 약의 오남용이 새로운 보건학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약을 먹는 환자 수가 늘어나 80대에 이르러서는 90% 이상이 약을 복용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10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의 오남용 사례는 노인층에서 더 심각하다. 하루 한 두 주먹 분량의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다. 특히 진료비 중에서 자기부담액이 없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이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젊은 사람들에 비하여 약의 대사 및 배설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경험한 환자 중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소화불량에 대한 약, 전립선 약, 척추 약, 정형외과 관절염 약, 신경과 치매 예방 약, 정신과 수면제 등을 하루에 60알가량 드시는 분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복용하지만 머리는 무겁고 몸은 항상 피곤하며 최근에는 다리가 부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또 다른 약을 처방해줄 의사를 찾고 있었다.
이 환자에서 부종을 유발할 수 있는 병적인 상태가 있는지를 서둘러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필자는 환자에게 약의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일단 모든 약을 중단시켰다.
일주일 후 다시 진찰을 했을 때에는 하지 부종이 사라져있었고 환자는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평소에 시달렸던 증세들 중 많은 부분이 약의 부작용이었던 것이다.
물론 모든 약을 무조건 중지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과를 조심스럽게 관찰 하면서 꼭 필요한 약을 단계적으로 추가하되 복용 약의 개수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약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약의 오남용으로 초래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필자는 내과 의사지만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종종 환자가 되어 다른 의사에게서 처방을 받는다. 의사는 자기 자신의 처방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분을 숨기기도 하는데 처방 받을 때 마다 의사가 내 병뿐만 아니라 나의 체질을 참고하여 처방해주기를 바라게 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는 심정으로, 국한된 병만 보지 말고 나의 전체적인 건강상태와 내가 복용하는 모든 약들을 참고하여 처방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인 것이다.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약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환자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자상한 주치의를 한 명쯤 두는 것이 좋다. 환자가 너무 많아 개인적으로 자세한 진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대형병원 의사보다는 집 근처 내과나 가정의학과 혹은 일반외과 의사면 더욱 좋을 것이다. 주치의에게 자기의 병세를 모두 이야기 하고 혹시 다른 병원 혹은 다른 과에서 약을 처방 받는 것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야 한다.
주치의는 환자가 복용하는 약들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서로 섞여서는 안 되는 약제가 있는지, 서로 상승작용 혹은 억제작용을 하는 약들이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주치의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시간이다. 전공분야가 다르거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약일 경우에는 일일이 검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러 과에서 처방을 받아야 할 때는 가능하면 같은 병원에서 처방 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전립선약은 이 병원에서, 혈압 당뇨 약은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기보다 한 병원에서 처방 받는 것이 좋다.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끼리는 서로 환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립선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처방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신장이나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피부과에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에 처방되는 약 혹은 알레르기비염을 치료하는 이비인후과 처방 약 때문에 당뇨가 악화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고혈압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붓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에는 꼭 처방전을 지참하여야 한다.
셋째,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약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해달라고 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약봉지에 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인쇄되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설명서는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설명서는 보통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약들이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약 복용 후에 불편한 증세가 나타나면 사소한 것이라도 꼭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약은 병에는 좋을지 몰라도 몸에 좋은 약은 없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꼭 필요한 약만 용량을 잘 지켜 복용해야 한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도 복용하는 환자도 약은 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