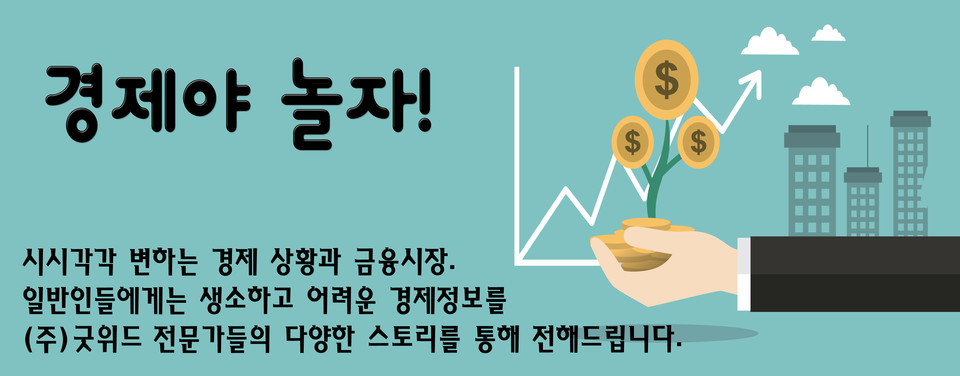
☞굿위드 경제야 놀자!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 1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서울북부지법 2021.4.6. 선고 2020나40717 판결)이 나와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고 1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왜 그러한지, 해당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오류가 있는지 살펴본다.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내용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2개월(만 1년) 근로를 마치면 제1항에 따라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제1항의 연차휴가는 매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매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1년의 기간 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15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므로 1년(365일) 중 36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해의 연차휴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서울북부지법 2021.4.6. 선고 2020나40717 판결의 내용
그런데, 서울북부지법 판결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을 인용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제60조제2항만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만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게 되므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48297 판결에 대한 오해
그러나 위 서울북부지법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는 회사의 규정상 정년퇴직일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안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였기 때문에 퇴직하는 해에는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발생요건인 1년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법 판결도 바로 이 ‘퇴직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고,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 날이다. 예를 들어, 1.1.~12.31.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2.3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이므로 12.31.이 퇴직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다음 해 1.1.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다. 즉, 4대 보험 상실일과 같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를 보면 12.31.이 정년퇴직일이므로 근로관계는 12.30.까지만 유지되어 ‘1년간’이라는 제6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법은 이 정년퇴직일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퇴직일의 의미(마지막 근무일)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이고, 과거 이와 다른 해석을 하였던 고용노동부도 2006년부터는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입장을 변경(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09.21.)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전혀 다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판결이니 이 판결로 인해 잘못된 노무관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