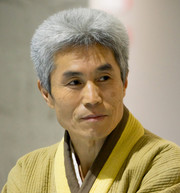
그런데 지금 사전에는 어찌하여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이상한 설명이 달렸을까요? 그것은 ‘언어 장애인’이라는 말이 등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어 장애인’이 등장한 순간, ‘벙어리’는 얕잡아 이르는 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 장애인’은 ‘벙어리’를 대접해주는 말일까요? 왜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언어 장애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도 1980년대일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며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던 때였습니다.
1980년대는 우리 사회가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보는 거의 온갖 단체가 다 등장합니다. 그 전의 시대에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불이익을 위해 투쟁했고, 그 결과 인권의 관점으로 사회도 서서히 눈을 떠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980년대는 그런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촉발되고 폭발한 시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체가 써야 할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제일 먼저 결성된 것이 농업인 단체였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농업인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농사꾼’이었죠. 전국농사꾼연합회라고 해야 하는데, 앞의 ‘전국’과 뒤의 ‘연합회’ 사이에 끼어있는 ‘농사꾼’에서 ‘꾼’이 거슬렸던 것이고, 그것을 ‘인’으로 바꾸어서 해결한 것입니다. ‘꾼’이 왜 거슬렸을까요? 다른 글자는 모두 한자인데, ‘꾼’만이 한자 말인지 순우리말인지 알딸딸했던 것입니다. 군(軍)이라고 쓰자니 군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또렷한 뜻이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농사꾼’을 ‘농업인’으로 바꿈으로써, ‘꾼’이 주는 말뜻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피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기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말에 대한 무지가 빚은 참극입니다. 이런 남의 말인 한자말로 우리 말을 갈아치우는 일은 이제 관행이 되어 우리 사회에 쓰나미처럼 밀려듭니다. ‘무당’을 ‘무속인’으로 바꾸고, ‘뱃꾼’를 ‘어업인’으로 바꾸고, ‘나뭇꾼’을 ‘임업인’으로 바꾸는 일은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납니다.
이 이상한 바꿔치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에 관한 ‘어설픈 앎’입니다. 한자는 한자끼리 엮어야 한다는 어설픈 앎이 이런 참극을 초래한 것이죠. 하지만 한자 말은 외래어이고, 외래어는 우리말입니다. 한자 말이 순우리말과 어울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농사꾼’을 ‘농업인’으로 대체한 것은, ‘어설픈 앎’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농사꾼들 스스로 우리말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말에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 말을 버리고 남의 말로 표현하려 들겠죠. 하지만 우리 말이 모자라거나 덜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들의 부정확하고 그릇된 생각을 ‘사전’에 반영하는 어리석은 학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100년 단위로 표준어를 개정하는 게 학계의 관행입니다. ‘지팡이’가 ‘지팽이’로 바뀌기 위해서는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더디게 현실을 언어가 뒤따라갑니다. 제 나라말의 원형을 지키려고 학자들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족: 지난번 연재가 나가고 난 뒤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노틀담의 꼽추’는 국립국어원의 기준에 의하면 ‘노틀담의 척추장애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한참을 웃었지만, 웃을수록 허탈해지는 일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