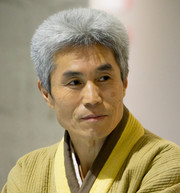
1970년대까지 아무런 탈이 없이 쓰이던 말이, 1980년대 사회 대변혁을 겪으면서 새로운 용어로 대체되더니, 이제는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결론까지 내려주는 이 친절을, 도대체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귀에는 아직도 우리 할머니가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소경’, ‘절름발이’라고 하던 말이 맴돕니다.
우리 할머니는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 같은 말을 모른 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를 철딱서니 없는 사람이라고 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게 해준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원망은, 그 말의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런 말 뒤에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토를 단 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자신들의 권위로 저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누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단 말입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이르면, 89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죽산 박 씨는 이렇게 웅얼거리셨을 겁니다.
“똥을 쌀 놈들!”
1980년대 사회 대격변 이후, 우리 말은 엄청난 변화를 강제로 입었습니다. 주로 사회 변화를 뒤따라가며 생긴 일이기에, 아직 그 말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저부터가 이런 변화가 어지러워서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뱃멀미는 머릿속의 감각과 눈의 감각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 멀미가 우리가 날마다 쓰는 말에서 일어나서 저는 거의 날마다 헛구역질을 합니다. 말을 뿌리를 더듬어보면 벙어리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없는데, 이 말에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질러서,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을 마치 죄인처럼 바라봅니다. 일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학자들이 사전에다가 버젓이 저질러 놓은 글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의 밑동을 도려내려는 학자들의 어리석은 작태를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요?
다음과 같이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토가 달린 말들에 대해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글학자들에게 ‘이의 있습니다.’
벙어리
난쟁이
언청이
꺽다리
얽음뱅이
절름발이
앉은뱅이
읽는 즉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마치 그림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어째서 그들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겨레 사람의 모습을 우리 겨레의 말로 그렸는데, 그게 어찌 그들을 얕잡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낱말을 떠올릴 때마다 저절로 감동이 입니다. 말의 뿌리를 알고 나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붙였을까, 또 그런 이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쥐어짰을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말을 후손인 우리가 잘 갈고 다듬어 써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바로 한글학자들입니다.
사전에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매우 그릇된 정보를 써넣은 한글학자들은, 지금 즉시 그 구절을 삭제할 것을, 겨레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