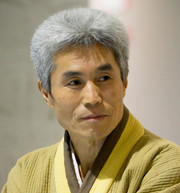
조선 시대의 옛 지도를 보면 청주 북쪽을 흐르는 물에 오근진(梧根津)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앞서 알아본 '오근장'과 '오창'의 연관어임을 알 수 있죠. '오창'은 '오근창'의 준말입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거기서 청주로 나오려면 큰 냇물을 건너야 하니, 뱃사공이 사람을 실어나르는 곳이 있어야 하겠고, 배 타는 곳이 '나루'이니, 그대로 '머귓벌나루, 먹벌나루'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평상시에 다리가 있었는데, 냇물이 불면 배를 타고 건넌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섶다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오가게 했겠죠. 청주시에서 돈 좀 들여서 이것을 복원하면 정말 멋진 풍물이 될 텐데요.
지도에 그려진 내를 따라 조금 더 아래를 보면 작천(鵲川)이 있고, 조금 더 하류로 가면 동진(東津)이 나옵니다. '작천'은 그곳 사람들이 지금 쓰는 현지어 '까치내'를 한자로 쓴 것임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동진'도 까치내를 한자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천=까치내=동진'이 되는 것이죠.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아이들이 설날을 맞으면서 신나서 부르는 노래인데, 까치설날이 어제라고 합니다. 이때의 까치는 새가 아니라

이고,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아버지는 '아찬 아재'라고 하는데 이것입니다. '까치설날'은 '아찬 설날'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치면 '설날 이브'죠. 신라 관직명에도 '아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찬'이 하루 중 시간으로 나타내면 '아침'입니다. '아찬'과 '아침'은 모두 '앛'에 접미사가 붙은 말입니다. 서열로 쓰일 때는 아찬이고, 시간으로 쓰일 때는 아침이죠. 아침은 방위로 하면 동쪽입니다. 서쪽은 저녁이고, 남쪽은 한낮, 북쪽은 한밤입니다. 이런 방위 개념은 조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상식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음양오행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이죠. 시간과 방위가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까치내'는 옛 표기로 하면 '아찬내'가 되고, 뜻은 '동쪽 내'가 되는 것입니다. 왜 동쪽 내냐? 냇물의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동쪽(아찬)에서 흘러오는 내이기에 '아찬내'가 된 것이고, 그것이 까치설처럼 '까치내'가 된 것이고, 한자로 작천(鵲川)이 된 것이고, 나루가 있는 곳에서 동진(東津)이 된 것입니다.
까치내는 동쪽에서 흘러오는 냇물이기에, 방향이 꺾이면 이름도 달라집니다. 까치내 옆에 동진이 있으니, 거기까지는 까치내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물줄기는 청주와 조치원 접경에서 다시 방향을 꺾어 서남쪽으로 흘러서 세종시를 통과한 뒤 한밭 시의 갑천과 만나 '곰강(錦江, 熊津)'으로 스며듭니다. 물길의 방향이 꺾이는 지점에서는 이름이 또 바뀔 겁니다.
냇물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알아본 '금천(金川)'도 마찬가지였죠. 방향과 관련이 있는 냇물 얘기하다 보니, '무심천'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무심천에 관한 어원은 민간어원설 외에 누구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심천에 관해 한마디 하면, 맞느니 안 맞느니부터 잘난 체하지 말라는 뒷공론까지 난무할 텐데, 말을 할까요? 말까요? 이보다 더 화나는 것은,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죠. 몰래 읽고 입을 딱 닫았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마치 자기가 발견해낸 양하는 거죠. 하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