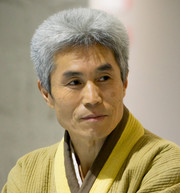
어원을 찾는 일은 민간어원설과 싸우는 피곤한 일입니다. 이 피곤함이 또 한 차례 청주에서 해일처럼 밀려듭니다. 옛날부터 청주가 배를 닮아서 '주성(舟城)'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데, 이 이야기는 시내 한복판의 절 유적을 포장하려는 설화입니다. 설화는 설화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실제의 현실에 끌어다 붙이려고 하면 큰탈 납니다.
운등사 주지승 혜원이 율양역 객방에서 하루를 묵는데,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배가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게 돛대를 세우라고 했다는 것이고, 용두사 주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지나던 초립동이 똑같은 말을 해서, 목암산에 올라가 10여 일을 살펴본 끝에 청주의 지형이 배 모양이라서 철당간을 세웠다는 것이 주성에 얽힌 불교 설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목암산'뿐입니다. 목(木)은 음양오행설에서 동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암산'은 '새암산, 쇠암산'이고, 이것이 '쇠(東)'가 '소(牛)'의 뜻으로 이해되어 '우암산'과 같은 말이라는 정도입니다. 청주의 동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도선국사가 중국의 풍수지리설을 수입했는데, 불교계에서 먼저 퍼졌을 것은 쉽게 짐작됩니다. 이런 유행이 '목암산' 같은 말에서 느껴집니다.
오히려 '주성'이라는 말의 뜻은 이 설화의 앞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발달한 역마가 청주 북쪽에 있었고, 그것이 '율봉역'인데(율양은 일제강점기 때 통합된 행정지명임.) 혜원 스님이 거기 객사에서 하룻밤 묵습니다. 증평에서 청주로 다가갈 때 만나는 동네가 구성리(九城里)입니다. '구성리'는 구담리(龜潭里)와 주성리(酒城里)를 통합하여 만든 행정용어. 면서기의 펜 끝에서 구(龜)가 구(九)로 바뀌었죠. 주성리에는 고개가 둘 있습니다. '아시고개'와 '수름재'.
'아시고개'는 청주로 들어갈 때 만나는 첫 번째 고개라는 뜻입니다. '아시빨래, 애벌레' 같은 말에서 볼 수 있고, 단군이 수도로 정한 '아사달'도 바로 이 '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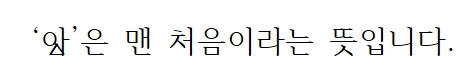
아시고개를 넘어서면 아시고개보다 더 높고 긴 언덕이 나타나죠. 그게 수름재입니다. 이 수름재를 한자로 번역하면 그대로 '주성(酒城)'이 되고 주정뱅이 느낌이 나는 술을 피해서 주성(舟城)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성의 우리말은 '배티'인데, 수름재와 같은 뜻입니다.
'수름'은 '술+음(접미사)'의 짜임이고, '술'은 '솔개, 독수리, 수라상' 같은 말에서 보듯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 우리말인데, 주로 몽골어나 만주어에서 흘러온 북방계 언어입니다. 증평 지나서 괴산 쪽으로 가다 보면 '울어바위'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울어'는 '수라'의 시옷이 떨어져 나간 모양입니다. 큰 바위라는 뜻이고 이때 바위는 돌덩이가 아니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고구려에서는 마을을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용박골 범박골의 '박'이 바로 동네를 뜻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박'은 '바위'의 준말입니다.
청주를 뜻한다는 '주성'은 '수름재(酒城)'입니다. 이것을 주성(舟城)으로 오인하여 철당간을 정당화하는 민간설화로 발전한 것입니다. 주성은 청주의 일부이지, 청주를 대신하는 용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민간어원설과 싸우는 일은 정말 피곤합니다. 또 이 말을 두고서 이러쿵저러쿵 떠들 게 뻔한데, 생각만으로도 미리 급(!) 피곤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