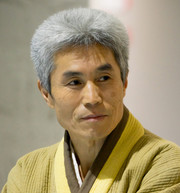
단양군 적성면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녀석에게 "너 어디 사니?"하고 물으면 이렇게 답합니다.
"대가리요."
아이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걔는 학교에 갈 때마다 이런 놀림을 받으며 삽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원래는 대가리가 아니라 '한가리'였답니다. 한가리가 일제강점기 때 면서기의 펜 끝에서 대가리로 변한 것입니다. '한가리'와 '대가리'는 일정한 번역 원칙이 있습니다. '한'은 우리말에서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대(大)'라고 옮긴 것이죠. 마치 '한밭'을 '대전(大田)'으로 옮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가리=대가리.
신라 경덕왕은 원래 우리말이었던 지역의 이름을 모두 한자식으로 바꿉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낯익은 모든 도시의 한자 이름들은 대부분 그때 생긴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큰 도시만이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시골 구석구석까지 모조리 한자식으로 바뀐 것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때 이름을 바꾼 사람은 각 지역의 면서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스무 살까지 살던 마을도 동네가 넷이었습니다. '산슴말, 나뭇골, 사쟁이, 사골'. 그런데 어느 날 국민학교에 입학하니, 제가 사는 동네가 '산정리 2구(나뭇골)'였습니다. 한 동네의 이름이 면서기의 펜 끝에서 이런 운명을 맞은 것입니다. 왜 산정리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뜻도 알 수 없습니다. 산에 정자가 있어서 산정리라는 황당한 민간어원설이 자리 잡았죠. 이때 면서기의 지식수준에 따라 동네의 품격이 천차만별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동네 지명입니다.
우리의 고민을 한껏 튀겨놓은 '미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면 이처럼 면서기의 펜 끝에서 나타난 이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멋대로 만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면서기의 지식수준이 어떨지는 몰라도 무언가를 자신이 아는 한에서 낱말을 바꾸었다고 보고 미호천의 어원을 추적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물길은 그 방향이나 모양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무심천'은 남쪽에서 흘러와서 붙은 이름이고, '까치내, 작천, 동진'은 동쪽에서 흘러와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미호천도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치는 미호천은 청주 충청대에서 조치원으로 건너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서 강은 멀쩡한 직선인데, 좀 더 위로 가면 까치내가 흘러오는 동쪽으로 꺾이고, 아래로 가면 세종시가 있는 서남쪽으로 꺾입니다. 크게 보면 S자로 돌며 양쪽의 땅을 휘감고 흘러가 대전의 갑천과 만납니다. 갑천과 만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드디어 공주 어귀의 금강(곰강)이 되죠.
여러분이 일제강점기하의 면서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부려져 돌아가는 물길 '굽으내, 곱으내'에 한자로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할까요? 서당에서 한문 교육을 한 1~2년만 배운 사람이라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한자가 있습니다. '미(美)'죠. '아름다울 미, 고울 미'자입니다. 면서기의 펜 끝에서 나온 이름이라면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남일면의 '아래고분터'가 '고은리'로 바뀐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곱은(曲)'이 '고은(美)'으로 바뀌었죠. '미호천'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은 '고은리'를 만든 그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호(湖)는 물길이 느려지고 넓어져서 호수의 느낌이 날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세종시로 들어가기 전의 느려진 물길이 만든 풍경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어감을 지녔기에 '미호'는 큰 저항 없이 그 전의 여러 이름을 제치고, 행정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