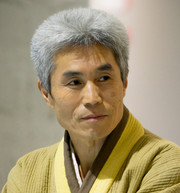
기왕 비교 언어학 얘기를 꺼낸 김에, 까짓것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청주 지역의 지명 중에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것대산, 팔결'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이게 우리말이 아니라 다른 말에서 온 것이기에 알쏭달쏭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려 때는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고,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의 지배도 받다시피 했죠. 그런 자취가 우리말 곳곳에 함정처럼 숨어서 우리를 골탕 먹입니다. 화냥년, 한라산, 마누라…. 그러니 언어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비교 언어학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고명하신 학자님들을 골탕 먹이는 '것대산'부터 보겠습니다. 상당산성 옆의 것대산에는 봉수대가 있습니다. 역마와 봉수는 몽골제국이 완성했습니다. 몽골어로 '부시(火), 부쇠(火鎌)'를 'kete'라고 합니다. 여기에 '산'이 붙어서 것대산이 된 것입니다. 고려 후기 원나라 지배 때 붙은 몽골식 이름이 한자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거질대산(巨叱大山)이라고 적었습니다. 叱은 시옷(ㅅ)을 적는 향찰입니다. 거죽산(居竹山)이라고도 적었는데, 竹은 '대'의 향찰표기죠. 이렇게 표기된 것대산은 '불을 피우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몽골어를 모르면 어원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래서 어원 연구에는 비교 언어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지명으로 가보겠습니다. '팔결'도 비교 언어학의 도움을 받아야 풀리는 지명입니다. 까치내를 설명할 때 같이 할까 하다가, 준비 안 된 여러분이 저를 미친놈으로 볼 것 같아서, 이제야 뒤늦게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까치내 위쪽이 팔결다리(八結坪)입니다. '다리'는 다리(橋)가 아니라, '들, 드르, 다라(野)'의 다리입니다. 벌판이죠.
청주는 처음에 백제의 땅이었다가 나중에 신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름도 상당현에서 서원경으로 바뀌죠. 초기 신라의 지배층(박씨)은 퉁구스어를 썼고, 후기 신라의 지배층(석씨, 김씨)은 터키어를 썼습니다. 팔결은 터키어의 자취입니다. 터키어로 동(東)은 'şark', 동쪽은 'doğu'이고, 개울은 'dere'입니다. 동쪽에서 흘러오는 냇물의 뜻인 '까치내'는 신라 지배층의 언어로 'şark-dere'입니다. '동천(東川), 동쪽들(東野)'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기록자의 귀에 'şark-dere'가 'seki-düğü'로 들린 것입니다. 터키어로 'seki'는 여덟(八)이고, 'düğü'는 매듭(結)인데, 이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 '팔결(八結)'입니다. 게다가 'düğü(매듭)'은 'doğu(동쪽)'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일어난 것이죠.
'팔결'에는 신라 지배층에 남아있던 퉁구스족(박 씨)의 영향도 있습니다. 동쪽 내를 뜻하는 까치내(아찬내)는 '작은 내'의 뜻으로 새겨지기도 합니다. 아찬이 작은 것을 뜻한다고 앞서 설명한 적 있지요. 그런데 퉁구스어로 여덟(8)은 'jakvn'이어서 퉁구스족이 '자그내'를 '여덟 내'로 들은 것입니다. 게다가 터키어에서도 여덟은 'seki'이어서 'jakvn'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터키어에서도 퉁구스어에서도 여덟(8)을 뜻하는 말소리는 터키어의 동녘을 뜻하는 말과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팔결다리(八結坪)'라고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퉁구스어로 광야는 'tala'이니, '다리'는 교각이 아니라 벌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팔결다리는 동쪽에서 흘러오는 냇물 주변의 너른 들(광야, tala)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 말과 지명에는 비교 언어학이 아니고는 안 풀리는 복병들이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골치 아픈 음운 변화 과정을 되짚어내는 게 싫어서 될수록 아는 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이런 기구절창할 일에 코가 꿰었으니, 환장할 일입니다. 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