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먹이 구하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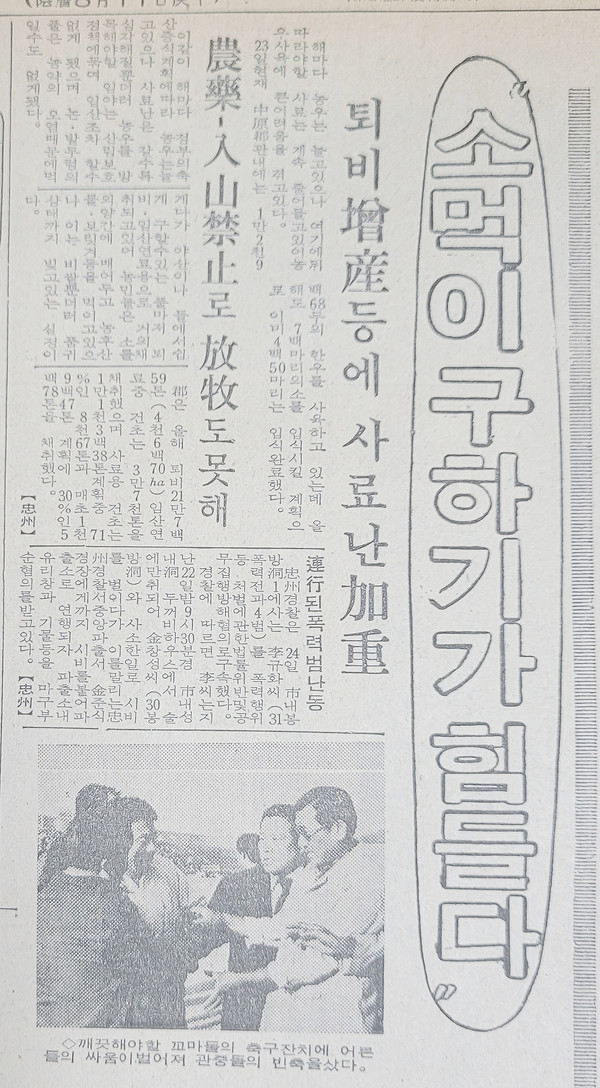
해마다 농우는 늘고 있으나 여기에 뒤따라야 할 사료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농우 사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현재 中原郡(중원군) 관내에는 1만2천9백68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올해도 7백마리의 소를 입식시킬 계획으로 이미 4백50마리는 입식 완료했다.
이같이 해마다 정부의 축산 증식 계획에 따라 농우는 늘고 있으나 사료난은 갈수록 심각해질뿐더러 농우를 방목해야 할 임야는 산림보호 정책에 묶여 입산조차 할 수 없게 됐으며 논·밭두렁의 풀은 농약의 오염 때문에 먹일 수도 없게 됐다.
게다가 야산이나 들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풀마저 퇴비·임산연료용으로 거의 채취되고 있어 농민들은 소를 외양간에 매어두고 농후산물·보릿겨 등을 먹이고 있으나 이는 비쌀뿐더러 품귀 상태까지 빚고 있는 실정이다.
郡은 올해 퇴비 21만7백59톤(4천6백70㏊) 임산 연료 중건초는 3만7천톤을 채취했으나 사료용 건초는 1만1천3백38톤 계획 중 71%인 8천67톤과 애초 1천9백47톤 계획에 30%인 5백78톤을 채취했다. <9106호·1974년 9월 26일자 3면>
소는 옛날 우리에게 가축이 아니었다. 식구와 한가지였다.
쇠죽을 끓여 소에게 여물을 먹이는 농부에겐 자식에게 보다 더한 정성이 있었다.
기계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그 시절, 소는 또 농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듬직한 일꾼이었다.
논을 써래질 하면서도, 밭을 갈면서도 농부들은 연신 “어더뎌뎌뎌~”로 추임새를 매기며 쟁기를 끌었다.
새끼를 낳는 암소에겐 더욱 정성을 기울였다. 새끼가 태어난다는 것이 농부에게 주는 의미는 재산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보다 정겨운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는 뜻이었다. 농부들에게 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았다.
그런 농부들에게도 가슴 아픈 이별이 기다리곤 했었다.
‘우골탑(牛骨塔)’, 소의 뼈가 모여 세워진 탑이다. 대학교를 그렇게 불렀다.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서도, 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 소원을 위해 당신들의 모든 삶을 갈아 넣었던 것이다.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게 그것이었다.
당신들이 못 배운 한을 자식에겐 절대 대물림해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를 팔았다. 부모도 울고, 자식도 울고, 그리고 소도 울었다.
그런 소에게 먹일 풀이 부족하다니 농부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터. 입산조차 할 수 없는 산림의 풀은 그림의 떡이요, 농약에 오염된 논두렁·밭두렁 풀은 안타까움이요, 퇴비 증산을 위해 모조리 베어간 들판의 풀은 허탈함이었을 게다.
정지용 시 ‘향수’처럼,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 있을까’마는 2024년 지금, 게으른 울음 우는 얼룩백이 황소는 이제 빛바랜 사진으로 남았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