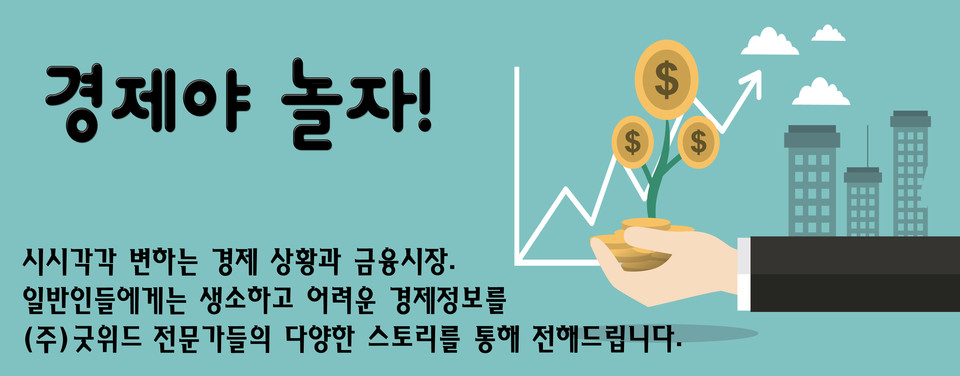
☞굿위드 경제야 놀자!
최근 상속의 시대를 맞아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와 맞물려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빈번해짐에 따라 상속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류분 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러한 쟁점이 부각된 것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신탁의 특성(신탁법 제2조 참조)에 따른 것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유류분의 경우 상속개시 시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상속개시 이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자는 1년, 상속인은 무제한)을 합한 것을 유류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을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볼지가 관건이다. 가령, 이를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본다면 수탁자인 (통상의) 금융기관 등은 제3자에 해당하여 1년 전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판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자산 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한 재산으로 보면서도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회사로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자산이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위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2020나11380 판결로 항소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판결을 제외한 나머지 하급심 판결은 대체로 수탁자에 대한 자산이전을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이를 종료시키고 신탁재산을 위탁자 명의로 복귀시킬 수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도 여전히 신탁재산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7069 판결의 경우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유언대용신탁의 성격을 해당 상속인에 대한 자산이전으로 보아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생각건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라는 민법적 제도로 담을 수 없는 유언자의 의사를 보완 또는 대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실상 유언자의 의사 역시 수탁자에게 특정 자산을 이전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수익자인 특정 상속인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함부로 유언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주류적인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이제는 이 같은 견해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약력>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 변리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변호사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고문변호사
(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이코노믹리뷰 / 삼성생명 WM 법률칼럼니스트
내일신문 경제칼럼니스트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