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부 1장 달빛 고요한 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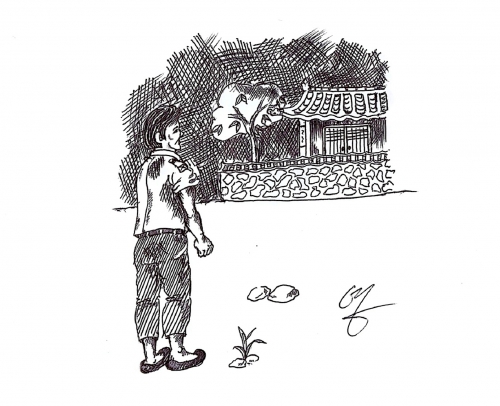 |
| ▲ <삽화=류상영 화백> |
"그람 이따 봐. 난 시방 집구석에 가서 단도를 갈아 놔야 하거든."
"그랴."
박태수는 싱긋이 웃으며 돌아서는 김춘섭의 말에 토를 달수가 없었다.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가는 김춘섭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허어! 멀쩡하던 개가 쥐약을 처먹다니. 라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려,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다 큰 개 아녀. 저울로 달믄 못돼도 사십 근은 족히 넘을껴.
박태수는 김춘섭이 했던 말을 가만히 되씹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 농약을 넣은 콩을 먹고 죽은 꿩도 내장을 파내고 먹으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물며 꿩보다 덩치가 큰 개라서 덜 위험할 것 같았다. 사십 근은 족히 나갈 독구를 학산장에 내다 팔면 못 받아도 쌀 한가미니 값 이상은 받을 것이다. 면장댁에서야 쌀 한가마니짜리 개가 쥐약을 먹고 나자빠졌다고 해도 아깝지는 않겠지만 보리죽도 귀한 요즘에 개고기를 그냥 땅에 묻어 썩히는 것도 죄가 될 것 같았다.
오늘밤 두 다리 뻗고 자기는 틀렸을껴.
박태수는 쥐약 먹고 죽은 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옥천댁이 걱정됐다. 옥천댁은 만삭의 몸이다. 아내의 말에 의하면 늦어도 다음 달 말이면 출산을 한다고 했다. 출산을 앞두고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죽었으니 불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다.
이왕 뒈져 버릴 개라믄 진작에 죽어 삐리지, 왜 해필이믄 이 때 죽는댜.
옥천댁이 살고 있는 안방을 한두 번 가 본 것이 아니다. 옥천댁의 남편인 이동하가 있을 때 아이들 돌잔치며, 이런저런 일을 거들고 돕기 위해 일 년에 몇 번씩은 갔었다. 부잣집의 안방이라 광장처럼 넓어 보이는 방이다. 그 넓은 안방에서 죽은 개에 대한 불안을 떨어내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지도 몰랐다.
아녀, 부잣집잉께 먼가 액땜을 하거나 방패를 했을 껴…….
박태수는 가슴 속에 뜨거운 그 무엇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 속에서 일어섰다.
둥구나무가지가 숨죽여 울고 있는 바깥의 바람은 제법 축축하다. 면장댁 대청마루를 밝히는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아직 깊은 밤은 아니다. 그런데도 비봉산에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온다. 필경 옥천댁도 부엉이 울음소리에 불안한 가슴을 문지르며 속울음을 울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둥구나무 밑 너럭바위에서 누군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온다.
둥구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너럭바위에 앉아 있는 올해 열 살인 진규가 모습이 보인다. 항상 저보다 나이가 두서너 살 많은 아이들과 어울리는 진규다. 진규는 제 형인 상규 또래의 광성이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규보다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 앉아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놈은 광성이 형 광일이처럼 보였다.
열여덟 살인 광일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전에 있는 잡화점에서 점원으로 근무를 했다. 잡화점 주인이 바뀌고 난 후에 집에 내려 와 있는 놈은 객지 바람을 씌었다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놈이 버릇없이 보이기보다는 어른처럼 보였다.
"거기, 진규 아녀?"
박태수가 진규를 부르는 목소리에 광일이가 담배를 등 뒤로 숨기며 엉거주춤 일어났다. 머뭇거리는 몸짓으로 뒤로 돌아서서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꾸벅해 보인다.
"불렀슈?"
진규는 마당에 서 있는 박태수를 발견하고 멀슥한 표정을 지었다.

